2021. 5. 9. 23:11ㆍ카테고리 없음
“권력으로 인한 고통을 받은 불우한 과거로 세상에 불신을 가지며 현재를 살아가는 형사 박해영과 1980년대를 살아가는 정의롭고 두려움 없는 형사 이재한이 무전으로 연결되며 여러 사건을 해결하며 과거를 바꿔나간다.“
이 이야기는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었던 드라마 ‘시그널’의 줄거리이다.

작품성과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력과 탁월한 연출로 아직까지 회자되는 이 드라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과연 저런 형사가 현실에도 있을까?”. 극 중에서 두 형사는 어떤 권력의 압박이 오더라도 정의만을 밀고나가며 사건을 해결하며 피해자와 어려운 이들과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다. 어떤 압박이 있어도,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선과 정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어릴 적 당연히 생각했던 경찰, 그리고 인간이었으며 시그널이 그리는 주인공들이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뉴스로 접하는 많은 소식들을 보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깨닫는다. 실적을 얻는 것에만 급하여 억울한 사람을 고문하고 대충 수사하며 사건을 풀지 못하고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경찰들, 또한 서로 비방하고 본인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허무한 웃음이 나오는 세상이다.

온갖 비리와 불의가 이루어지는 시그널 속 세상은 이미 우리 현실이고 시그널의 주인공들은 그저 이상이라고 불린다.
과거와의 연결이 아닌, 이런 사람이 판타지로 다가오는 희한한 세상이다. 왜 어렸을 때 생각하던 너무나 당연하게 옳은 것들은 이상이 되어버리는 것일까? 우리는 왜 당연을 상실한 세상에서 사는 것일까? 너무나도 의문인 부분이다. 나는 이런 의문과 허무함이 생길 때면 가장 인상 깊은 책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책, 13.67을 읽고는 한다.

13.67의 작가인 찬호께이는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란 작가이다. 우연히 공모전에 낸 글이 당선되어서 작가가 된 그는 신작마다 히트를 치며 일본 추리소설의 전설 히가시노 게이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바로 13.67이다.

이런 13.67을 내가 접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평소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본인이기에 읽을 만한 추리소설을 물색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제목이 특이한 13.67이라는 책을 발견하고는 거리낌 없이 책을 구매했다.
13.67의 의미는 2013년과 1967년이다. 제목에서도 유추가 되는 것처럼 13.67은 시간적 역순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가장 첫 번째 단편은 2013년, 마지막 단편은 1967년이다. 전설적인 형사였던 관전둬는 첫 단편에서는 식물인간이다. 그리고 조금씩 과거로 흘러가면서 작가는 관전둬라는 인물을 보여준다. 관전둬는 암울하고 어두웠던 홍콩의 역사 속에서도 신념과 정의를 잃지 않는 낭만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소설에서도 관전둬 같은 인물은 많지가 않다. 관전둬가 아끼던 형사는 결국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하여 권력과 총명한 머리를 이용해 살인을 마다하지 않는다. 부패한 경찰조직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럼에도 관전둬는 공공의 정의를 생각한다.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관전둬의 제자인 뤄샤오밍은 이런 서술을 한다.
“다른 사람들이 평온하게 백색의 세계에서 살아가도록 관전둬는 계속 흑과 백의 경계를 떠돌았다. 뤄 독찰은 알고 있었다. 비록 경찰이 진부하고 관료적이고 권력자와 결탁하고 정치적 임무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조직으로 변한다 해도 사부만큼은 변함없이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킬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 그가 범죄자를 체포함으로써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악당을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관전둬는 자기 자신을 시커먼 늪에 던져 넣는 한이 있더라고 그들의 방식 그대로 그들을 상대할 것이다.”
나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세상이 매우 어두운 공간이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있다. 그 속에서 누군가, 아니 많은 사람들은 조명을 들고 여럿을 비춰줘야 밝아지지만 지금 우리는 그저 누군가 빛을 비춰주기만을 기다리고 자기 자신만 편하고 안전한 빛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과연 이런 이기적이고 안일한 생각이 정의로운 것일까?
정의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지만 나는 정의는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옳은 도리, 당연한 됨됨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서로를 돕고 공정하게 판단하며 공감하고 옳은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정의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런 당연한 정의는 결여되어있다.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은 그 상처로 인하여 비관적 선택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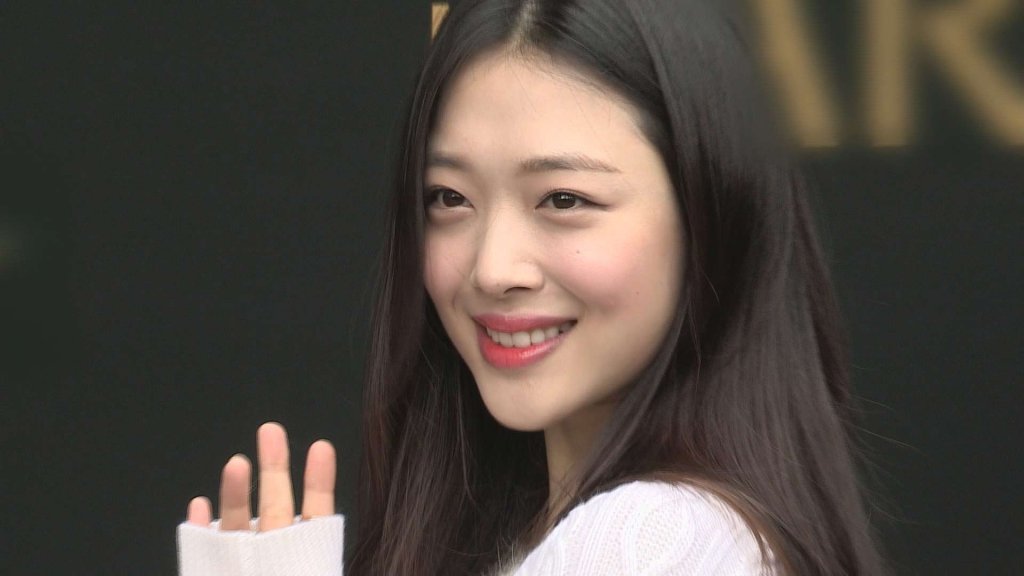
사회적 악인을 욕하지만 정작 그 누구도 정서적으로 결여되어있고, 어렵고 불우한 상태에 있는 이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고 그저 외면한다. 좋은 일은 “누군가 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외면하고 본인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들은 누구라도 먼저 하려고 경쟁한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당연한 모습으로, 정의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절대로 당연한 모습도 정의도 아니다.
표창원은 본인의 저서 정의의 적들에서 이런 말을 한다.
“정의는 옳음이다. 하지만 아무나 멋대로 내가 옳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적, 철학적, 종교적 혹은 논리적 근거”
표창원의 말대로 정의에는 마땅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정의의 근거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정의, 본인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자리잡고 있다. 혹자는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왜 당연한 것들이 이상이 되었는지 나는 묻고 싶다. 본인을 위해 경쟁하는 것을 결코 옳은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 누구도 어둠에서 빛을 비추어 주려고 하지 않으며 누군가 본인에게 빛을 비춰주기만을 바란다면 사회는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암울해질 뿐이다.
나는 이 정의에 대한 해결책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해답을 13.67이 주고 있다.
서로를 깎아내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남을 비춰주는 것이 당연한 정의라고 나는 생각한다. 모두가 백 속에만 있으려하고 흑을 멀리하는 흑과 백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한다.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비춰준다면 세상은 더욱 밝아질 것이고 그 빛이 많아져 서로를 비춰준다면 역설적으로, 아니 당연히도 결국 가장 밝은, 당연한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고 아름다운 세상, 또한 정의일 것이다. 나는 이런 당연함이 당연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